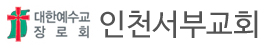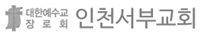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처녀는 매일같이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알프스 계곡을 찾아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하루 해를 보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년,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아름답던 처녀의 모습은 어느덧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날 할머니는
계곡의 물줄기 속에서 떠내려 오는 한 청년의 시신을 끄집어 내어서
품에 안고 슬프고도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할머니의
젊었을 적 애인 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알프스를 등반하다 실종되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만년설 속에 묻혀 있다가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젊었을 적 모습 그대로 떠내려온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읽은 슬픈 전설 같은 러브 스토리가 요즘 들어
부쩍 떠올려 집니다. 한 인간이 또 다른 한 인간을 이토록 유정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추억할 수 있는가(?) 해서 말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들으면 박물관용 러브 스토리라고 비웃겠지만 만남도 이별도 벼락치기로
해댄다는 요즘 젊은이들의 인스턴트식 러브 기사가 토픽에 실린 것을
보고는 마음에 실소를 금치 못 했습니다.
일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구하는 것도 비즈니스 하듯 계산기를
두드리며 마주앉은 요즘 젊은이들은 과연 무엇(?) 에다 인생의 가슴
찡한 감격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의문 스럽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다 결합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사람 이라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지순한 사랑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음미해 보기 위해 오늘도 알프스 산자락
처녀의 순애보를 떠올려 봅니다.
“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고전 13 : 4 ~ 7 )